
창비의 테마 소설 시리즈 중 하나인 '숨 쉬는 소설'은 읽어보기 전부터 기대가 참 컸다. 이 소설 시리즈의 이전 판이었던 '기억하는 소설'에 참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숨 쉬는 소설'이라는 제목, 그리고 책을 받아 보았을 때의 표지에서 단번에 '이 책은 생태, 환경, 지구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책을 몇 페이지 읽어본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뒤바꾸었다.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인류의 삶, 인류의 실수, 인류의 선택, 인류의 후회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환경'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나도 한참을 해왔던 생각이기도 하다. 허용 기준치라는거, 정말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왔다. 기준치가 500이라면.. 499까지는 안전한가? 절대로 아니지 않을까? 기업에서는 정말로 교묘하게 기준치에'만' 넘어서지 않도록 단가를 따지고, 이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 다양한 첨가제, 다양한 재료들이 발견되고 개발되기도 한다. 항상 몸에 좋은 것, 해롭지 않은 것은 단가가 비싸다. 발전의 방향 자체가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많은 이익이 남게'로 향하고 있는 탓이겠지. 그 방향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게'로 바뀐다면 누구나 당연하게 해롭지 않은 것을 쓰고, 허용 기준치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안전한 세상에 살아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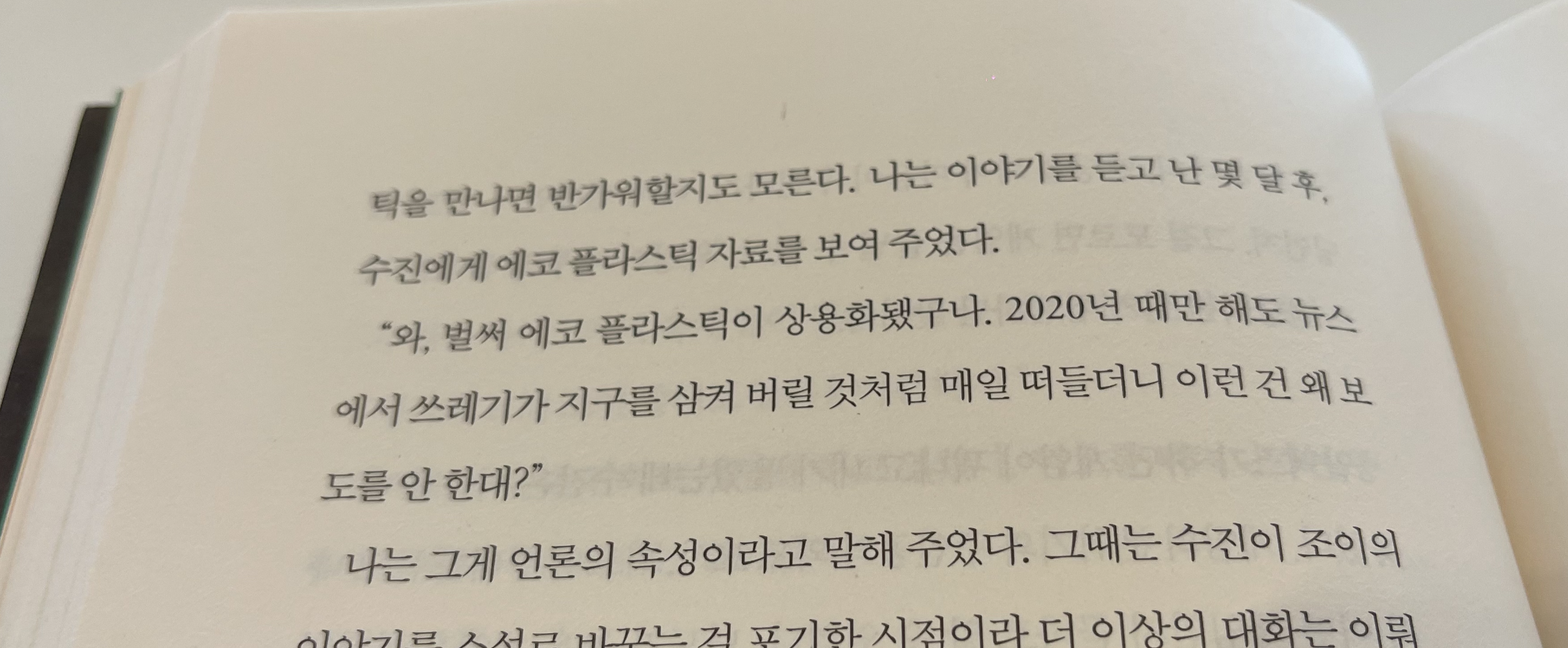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스스로 녹아 사라져버리는, 환경에 전혀 해롭지 않은 신소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생겨난 시대에도 언론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인가 보다.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소리를 지겹도록 들어왔다. 수도꼭지마다 물 부족을 강조하는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다. 이는 반은 사실이고, 반은 틀린 말이다.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설 연구소와는 다르게 UN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43번째로 물 사용이 풍요로운 국가이며, 공식적으로 '물 부족이 아닌 국가'에 포함된다고 한다.
물론 물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맞다. 불필요하게 물을 낭비하고, 콸콸 흘려보내는 것은 굳이 없어도 되는 행동이다. 다만, 그 누군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각종 말도 안되는 물 부족 대비 정책을 펼쳐내고, 홍보하고, 퍼 날랐는지가 참 궁금하다. 과연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렀는지 궁금하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처음 펼쳐보았던 꼭지다. '신체 적출물'. 제목부터 뭔가 호기심이 가고 무섭기도 했다. 신체 적출물은 말 그대로 신체에서 떨어져나온 신체였던 것의 일부를 말한다.
태국 병원의 간호사는 '신이 당신에게 준 몸이니까요.'라는 이유를 들어 투명한 유리병에 수술을 통해 잘린 발가락 일부를 담아주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방역관은 '방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소각 예정입니다.'라며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다.
방역, 감염병 등의 주제를 벗어나서 태국에서 신체 적출물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부 처리도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를 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부처리가 되지 않은 한 언젠가는 물속에서 부풀고, 상하게 될 것이 뻔하다. 아마도 신체에서 떨어져 나간 나의 몸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탄생부터 쭉 내 몸에 붙어있던 일부분을 그저 '사고', 그리고 '수술'이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강제로 떼어내는 모양새를 거치다 보니, 대부분은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고 작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닐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경이고 생태다.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진다. 우리는 한 순간을 살고 떠나는 자연환경의 일부인데도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간다. 특히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면 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몸에 해롭지 않은 것들은 비싸고 희귀해서 누구나 마음 놓고 구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에 의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경에 흔적을 남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어나 살아가는 그 찰나같은 시간 동안, 주제넘는 흔적을 남기지 말기로 적어도 노력은 해 보자. 우리에게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갈 권리는 없으니까.
이 글은 '창비'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TREY [학교, 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라질 거예요, 어린이의 노래 (어맨다 고먼)_창비 (0) | 2021.11.01 |
|---|---|
| 📙처음 가는 마음(이병일)_창비 (0) | 2021.09.22 |
|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진로교육(김덕년 외 2인)_교육과실천 (0) | 2021.09.05 |
| 만남이란 어떻게 이어질 지 모르는 것 (1) | 2021.09.05 |
| 📙올리브와 레앙드르(알렉스 쿠소)_창비 (0) | 2021.09.02 |

